세브란스병원 포함 극히 일부 제외하곤 ‘전문의 태부족’ 소아 발병 시 선제적 진단 중요… 부모는 ‘뇌허혈 발작’ 관찰해야 6기까지 진행… 뇌경색 발생 전 수술 등 종합적 판단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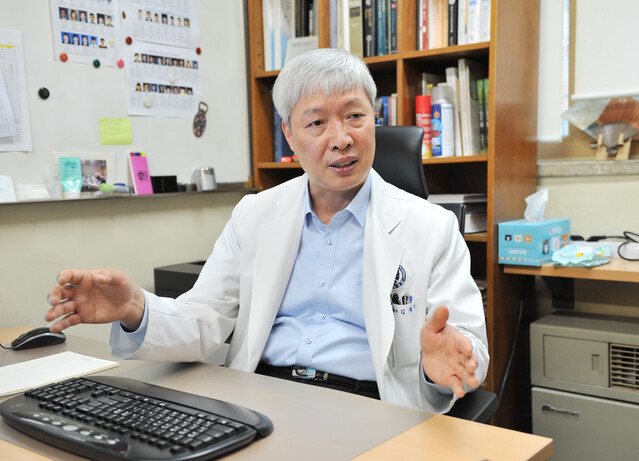
- ▲ 김동석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모야모야병은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 종종 다뤄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정상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에 부족한 혈액량을 공급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미세혈관이 자라는데, 이 모양이 마치 연기가 피어나는 모양과 비슷해 ‘모락모락’이라는 뜻의 일본어 ‘모야모야’로 명명됐다.워낙 특이한 질병명이라 의외로 익숙해진 부분이 많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보는 국내 의사의 수는 적다. 특히 소아신경외과의 영역에서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문제는 모야모야병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의 어려움은 명확한 치료법을 알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명의를 찾아 전국을 돌고 도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방 한계에 부닥치기 마련이다최근 본지는 모야모야병 명의인 김동석 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를 만나 현 상황을 짚어봤다.김 교수는 “모야모야병은 뚜렷한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와 성인 등 연령대에 따라 구분된다. 문제는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그 증상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일시적으로 1~2분 정도 말이 안 나오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자가 판단이 쉽지 않다. 부모 역시 질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아이의 실수로 받아들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그는 “소아·청소년기에는 일시적 증상들이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장애나 잔여 증세를 남기지 않고 회복된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뇌경색의 초기 증상이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장기간 증상이 있었음에도 환아의 부모들은 일시적 증상인 탓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히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보통 암은 4기로 구분되지만, 모야모야병은 6기까지 있다. 그만큼 완치가 힘들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선제적 진단이 이뤄지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김 교수는 “병이 시작하는 1단계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2~3기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4기에 증상이 가장 심하다가 5~6기가 되면 오히려 증상이 없어지기도 한다”며 “뇌경색이 발생하기 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모야모야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내과적 치료는 없으며 수술이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임상 증상의 진행 양상, 뇌혈관 폐쇄의 속도와 정도, 측부 혈관의 발달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래 불투명한 소아신경외과, ‘제도 개선+투자’ 절실모야모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국내 10명이 안 된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소위 빅5병원 중에서도 일부만 있고 지방에는 없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김 교수 어깨에 실린 짐은 무겁다.그는 “학회에 소속된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는 약 3000명 정도다. 그런데 소아신경외과만 하는 의사는 10명 미만이다. 이는 후학 양성이 어렵다는 지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어 “이 분야를 다룰 차세대가 없다는 것은 암울한 미래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아 질환을 다루는 모든 의료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선제적 진단과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질환이지만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변방에 속한다. 이는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맹점 중 하나다.소아 외과수술은 고난이도 술기가 적용돼야 하는데 낮은 수가 문제로 인해 전공의들이 선택하지 않는 분과로 낙인이 찍혔다.김 교수는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의료인들에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라며 “해결책은 공정한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환자 수가 적고 난이도 있는 수술을 하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제공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만 소아신경외과라는 비인기 분과를 선택하는 후학이 나타날 것이며 안정적 진료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그는 “지금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내 소아신경외과는 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투자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