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가격 병원간 천차만별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 소비자 피해진료비용 정보공개 유명무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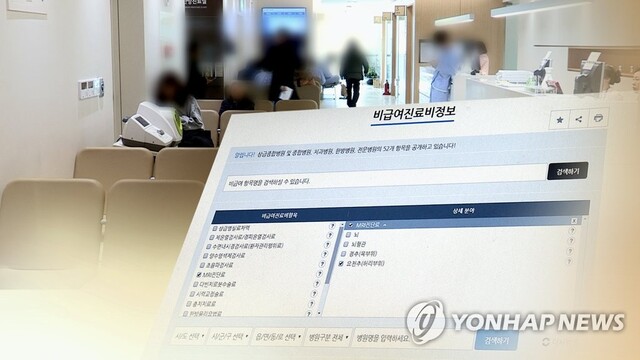
- ▲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갈수록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 등 보험 가입자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비급여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565개)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전체 75%인 387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작년보다 인상됐고 107개는 물가상승률(연 3.4%)보다 많이 올랐다.
올해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한다.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관 별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들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실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경남의 A의원은 약 30만원이었던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을 받고 있었다. 30배 가량 차이가 난다.
평균금액이 3.7%가량 인상된 도수치료의 경우 같은 서울에서 C의원은 10만원을 받았지만 D의원은 60만원을 청구했다.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하이푸시술(자궁근종)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서울의 E의원은 30만원에 불과했으나 경남의 F의원은 2500만 원을 받았다. 80배가 넘는 격차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질병(또는 진단명) 단위의 총액이 아닌 비급여 항목별로 공개를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학용어로 된 비급여 명칭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고 가격외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비가 저렴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자 할 때 진단명으론 검색이 어렵다. 고주파제술 150만원, 치료재료 30만원, 경부초음파 8만원 등 비급여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다. 이를 비교해 치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한 설문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동네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됐지만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공개제도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정부가 가격 및 의료기준을 관리하나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 영역으로 과잉진료 및 가격 널뛰기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가격규제의 부재는 비급여 의료 쇼핑 등 공급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불필요한 재정 누수로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 ▲ ⓒ연합뉴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권과 의료계 시선은 보험금 청구 중계기관 지정 여부에 쏠리고 있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이 의료비나 처방약 가격을 심사하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전국 병·의원과 전산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평가지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듯 국회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청구 중계기관은 확정하지 않았다.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청구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낙점되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매출 비중이 높은 병원일수록 반발은 더 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진료 비용·횟수 규모가 크거나 그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 항목을 검토·선정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도한 자율권 남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비급여 가격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