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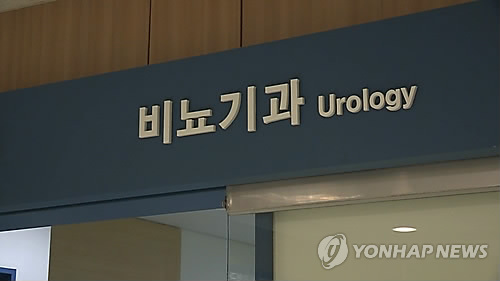
- ▲ ⓒ연합뉴스
의료계가 대국민 인식 개선과 진료 영역 확대 등을 이유로 병원의 전문 진료과목 '문패'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과목은 익숙한 이름의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에서부터 일반인에게 다소 낯선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핵의학과 등 26과다. 이들 진료과목 중 원래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은 진료과는 10여개에 달한다.
일부 진료과에서 명칭을 바꾸고 싶다고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타 진료과들로부터 명칭 변경 동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승인, 이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 익숙했던 이름을 버릴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이유가 진료 과목에 대한 인식 전환 차원에서다.
최근 진료과목명이 변경된 '비뇨기과'가 그 예다. 비뇨기과계통 의료계는 그간 비뇨기과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성'(性) 중심으로 굳어져 환자가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다. 의사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기피 진료과인데다가, 개원가 사정이 녹록치 않아진 상황도 개칭 추진과 무관치 않다.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배뇨질환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비뇨기과 진료에 대해 국민들이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히려 배뇨질환 의약품 처방이 전문과인 비뇨기과가 아닌 타과에서 60%나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뇨기과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개칭된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다. 원래 명칭 '정신과'에서 '정신병자'가 연상되는 부정적인 어감을 지우기 위해 이름이 변경됐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정신과가 다양한 진료를 하는 분야임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진료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개칭이 추진되기도 한다. 이는 밥그릇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변경 과정에서 타진료과와의 충돌을 겪기도 한다.
지난 2007년 '소아과'에서 개칭된 '소아청소년과'를 꼽을 수 있다. 소아과는 저출산 타격이 심해지자 진료 대상이 10대 후반까지라고 인지시키고자 개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료 영역이 겹치는 내과의 반발이 거셌다. 개정 이후 내부 갈등으로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탄핵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前회장(소청과)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내과의사와 소아과 두 과의 의사들이 청소년들에 관해 쓴 10년간 논문을 분석하니 소아과 의사들의 논문 수가 4배나 많았다"면서 "청소년 진료가 소아과의 역할이라는 것을 방증했던 것으로, 진료의 영역을 정확히 한 것"이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비슷한 배경에서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대표적이다.
'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 저출산으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대표적인 기피과목 중의 하나인 산부인과는 진료영역 범위가 훨씬 방대한 여성의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이해관계가 얽힌 피부과·성형외과·내과·가정의학과 등 타과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 실패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학회 명칭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비록 학회 명칭이지만 10년 넘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타과와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진료과목명 변경이 쉽지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다른 영역으로 확장은 결국 남의 영역을 뺏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해 제대로된 진료를 받도록 하는 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비뇨기과→비뇨의학과, 소아과→소청과…진료과명(名) 탈바꿈, 왜?
- 김민아
입력 2017-11-15 13:53수정 2017-11-15 16:44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대국민 인식개선, 진료영역 확대 등 이유로 잇따른 시도
김민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