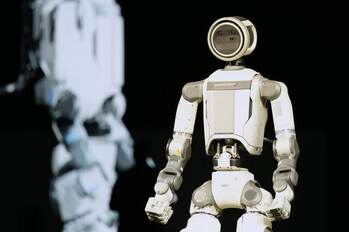"적자성 채무 가파른 증가, 국민 실질적 상환부담 가중""채무 관리목표 부재 … 구체적·실효적 방안 제시할 필요"
-

- ▲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9일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채무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 적자성 부채가 전체의 70%를 넘어서며 국가 재정의 경고등이 켜졌다. 악화된 경제 상황 속 재정 투입으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나, 정부가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목표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923조5000억원에 달해 전체 국가채무 1300조1000억원의 71.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적자성 채무란 상환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있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가채무의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채무의 질적 악화까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더욱이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른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407조6000억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8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연 평균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머물렀다. 증가율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의 5.6배에 달한다.2차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2024년말 대비 125조4000억원 증가할 계획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가 108조1000억원, 금융성 채무는 17조3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2차 추경 기준 2024년말 대비 국가채무 증가의 86.2%가 적자성 채무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6.4%에서 2024년 69.4%로 13.0%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반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은 2019년에 43.6%에서 2024년 30.6%까지 하락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국가채무 총량 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의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만 존재하고 적자성 채무에 대한 관리목표는 부재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7개 선진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D2) 비율도 2020년 122.0%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08.2%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0.3%P 상승한 108.5%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0년 45.9%로 상승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4년 기준 52.5%까지 올랐다.이에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순위는 최근 상승하는 추세다.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7년 기준 37개 선진국 중 31위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8위를 기록했고 2024년 기준 21위까지 상승했다.한편 정부가 2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2차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대비 2026~2028년 30조7000억~54조3000억원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도 같은 기간 0.6~1.9%P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내년에 50%를 넘어선 50.3%를 기록한 이후 2028년에는 5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