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장기연체 채권 조정, 동의 없는 세금 투입 논란투명성·인센티브 부족에 금융권 '의무화 비용' 불만 고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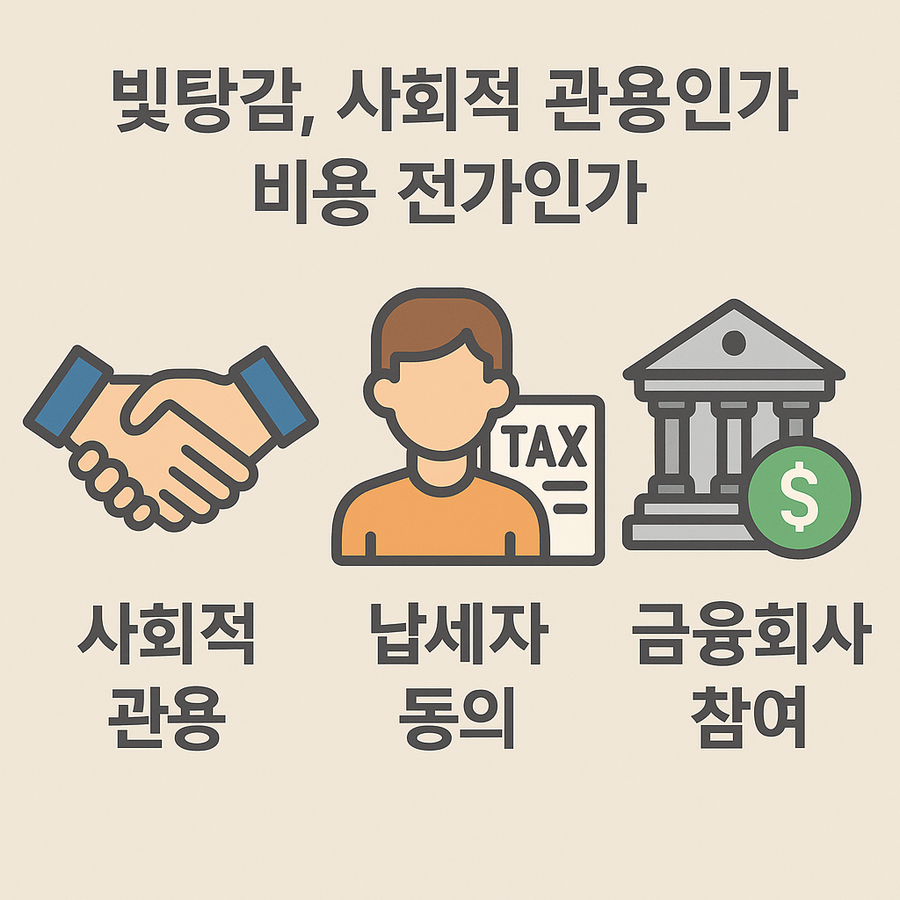
- ▲ ⓒ챗GPT
금융위원회가 19일 연체 7년 이상·채무 5000만원 이하 장기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조정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확대 개편을 동시에 발표했다.규모와 속도 면에서 파격적이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회적 관용’과 ‘납세자 동의’, ‘금융회사 참여’라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놓고 보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적 관용 vs 국민 덤터기 … 납세자 동의 없는 ‘밀어붙이기’ 논란채무조정은 ‘실패한 이웃을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에 기반해 개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 복귀를 돕는다. 하지만 이번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 매뉴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재기 실패자에 대한 추가 안전망이나 재심사 체계도 부재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남긴다.채무조정을 위한 8000억원의 재정 투입은 납세자의 세금이 쓰인다는 점에서 납세자 ‘동의’가 필수다.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공론화나 동의 절차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 때문에 “내 세금으로 타인 빚을 탕감해줘야 하느냐”는 반발 여론이 적지 않다.금융위 측은 “대상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심사 지표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납세자에게 정책 취지와 성과를 알릴 공적 플랫폼이나 피드백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다.◇금융회사 참여, 실익 없이 ‘의무화’되나또 전체 매입액의 일부인 수천억원을 민간 금융사가 분담해야 하지만 단기 비용 대비 장기 이익 보장은 뒷전이다. 연체채권 매입가격(5% 수준 제안)과 심사 타임라인(3~6개월 소요) 등 구체적 조건이 불투명해 금융권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한 시중은행 임원은 “재정적 인센티브(세제 혜택·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ESG 가점), 제도적 안정장치(표준 지침·리스크 분담), 사회적 명분(공공기관 거래 우대·공동 홍보)이 모두 갖춰져야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완성은 “후속 조치”에 달렸다새출발기금과 장기연체채권 조정 프로그램은 ‘사회적 관용’의 제도적 실현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납세자 동의와 금융회사 참여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은 ‘불완전한 대증요법’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금융위 대책이 단순한 ‘대증요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가 관건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감면 기준과 결과를 온라인에 낱낱이 공개하고, 납세자 소통 채널을 공청회·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해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 역시 법제화·운영 차원에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